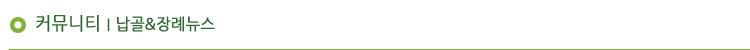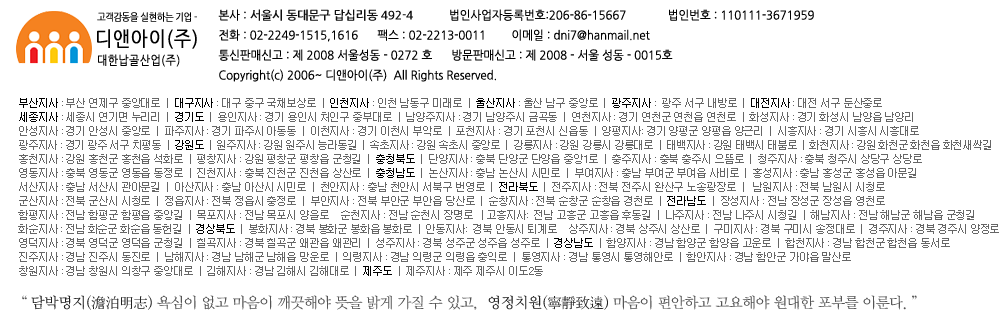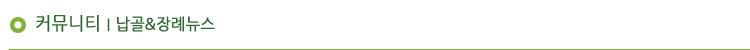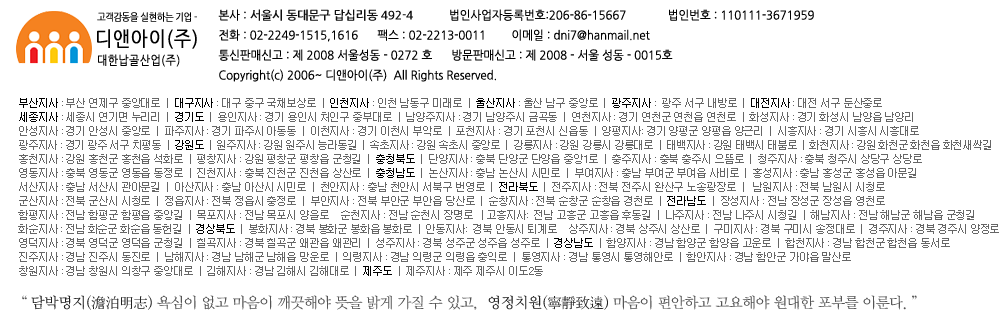작성일 : 07-11-19 10:05
작성일 : 07-11-19 10:05
|
글쓴이 :
 조회 : 2,697
|
장례산업 시쳇말로 “돈 되네”
유골 다이아몬드에 우주납골당까지 등장… 선불식 상조회사 ‘먹튀’ 주의 요망
“마지막 가시는 길, 내 부모님처럼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장례사업이 확산일로에 있다. 웰빙 못지않게 웰다잉(잘 죽는 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겨냥한 독특한 서비스나 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일명 ‘메모리얼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유골 다이아몬드도 출현했고, 가신 뒤에라도 호강하시라고 우주장례 서비스도 선보였다. 유골분이 담긴 펜던트를 목에 걸고 다니는가 하면, 수목장에 이어 화장의 반대 개념으로 영하 18℃에서 냉동 후 질소 처리를 거쳐 기계진동으로 분쇄시키는 장례법인 빙장(氷葬),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바다장도 등장했다.
우주장 비용 1700만 원 소요
유골 다이아몬드 상품을 선보인 알고르단자코리아 안중현 사장은 “화장 시 고인의 유골에서 추출한 탄소를 고온·고압 처리하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다이아몬드가 나온다”며 “이민을 가거나 배우자가 병약해 납골당에 자주 찾아가기 어려운 유족들이 주로 상담한다”고 전했다. 장례서비스업체인 국민상조는 지난 2월 ‘우주장’ 시행업체 미국 셀레스티스 사와 계약하고 국내 우주장 판권을 사들였다. 이 회사의 조명환 과장은 “고인의 유골분이나 머리카락 등을 특수 캡슐에 담은 뒤 로켓에 실어 우주로 쏘아올리는 장례법”이라며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골분 펜던트를 생산하는 골드앤실버의 박성철 사장도 “아직 대중적으로 자리 잡지는 못했지만 화장장이나 영안실 등에서 상품을 본 고객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우리 회사와 같이 장례와 관련한 상품을 내놓고 특허출원을 하는 기업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하지만 우주장 1700만 원, 유골 다이아몬드 0.3캐럿에 400만 원 선으로 그 가격대가 높아 주문은 미미한 상태다.
최근 장례사업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2001년 장사법에 대한 법률이 제정된 후 수목장뿐 아니라 헬기장, 해양장 등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장례 문화가 생기고 있다. 여기서 파생되는 다양한 장례산업은 향후 블루오션의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서울보건대 장례지도과의 이필도 교수는 “고령친화사업의 일환으로 웰 엔딩(Well ending)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이라며 “사후준비를 금기시하던 과거 분위기가 줄어들고,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모색하는 경향이 늘었다”고 전했다.
현재 장례산업을 주도하는 그룹은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로 운영하는 상조회사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영업 중인 상조업체는 300개에 달한다. 1999년 말 80개, 2004년 100개에 비해 3∼4배 정도 부쩍 늘어난 수준이다.
상조회사란 1950년대부터 시작한 일본 상조회를 차용한 것으로, 장례에 필요한 물품과 인력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서비스업체다. 회갑·칠순·돌잔치 등 가족행사까지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지만 현재는 장례가 주력이고, 영업형태는 가입 회원이 100만∼1000만 원의 다양한 상품을 선택해 5~10년 동안 월 2만∼6만 원을 나눠내는 식이다.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처음 계약한 가격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사업이다. 최근엔 전광렬, 노주현 등 인기 연예인을 앞세워 홈쇼핑 케이블TV에서 하루 만에 2000∼3000건의 상품이 팔기도 했다.
상조회사들이 우후죽순처럼 불어나는 이유는 최소한의 행사 비용만 들이면 회원들이 다달이 내는 회비를 제 돈처럼 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회원을 최소 1만 명만 확보해도 월 회비 2만 원 기준으로 매달 수입이 2억 원. 업계 공식통계인 사망률 0.3%를 잡아 30건 장례에 행사비 200만 원을 쓰면 월 지출은 6000만 원 안팎으로 순이익은 1억4000만 원에 달한다. 이 같은 수익구조 탓에 보험이나 다단계사업에서 일하다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상조회사 회원 수 부풀리기 만연
상조회사들의 회원 수 부풀리기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수준이다. 관련 업체가 워낙 많고 업체마다 밝히는 회원 수도 천차만별로, 업계를 대변하는 협회 수만 한국상조연합회, 상조연합CEO CLUB(전 전국상조연합협의회), 전국상조협회 등 4~5개에 달한다. 업계 1, 2위를 다투는 회사들은 추정치의 서너 배인 50만 명 이상 회원을 확보했다고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기업이 주장하는 회원 수를 다 합치면 아마 우리나라 국민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는 농담이 통하는 이유도 그래서다. 업계에서는 연간 상조 서비스 시장 규모를 최대 3조 원으로 잡고 있다.
문제는 일본 상조회가 회사 설립부터 자금 운용, 소비자 약관, 결산까지 정부 규제를 받고 있으며, 상조 상품이 ‘돈을 미리 내고 서비스를 나중에 받는다’는 점에서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판매’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국내 상조업체는 신고만 하면 설립이 가능한 자유업이라는 것이다. 서비스 제공이나 판매방식과 같은 형식은 빌려왔으나 소비자가 맡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보증 시스템이나 회사 설립의 법적 규정 등 핵심은 버리고 왔다는 것이 학계 등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 때문에 ‘먹튀’ 상조회사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접수하 상조업체 관련 민원은 184건으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42.6%가 늘었다. 소비자 피해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비자 피해 유형별로는 ▲ 중도 계약 해지에 따른 사업자의 과다한 위약금 요구가 가장 많았고 ▲ 소비자의 계약 철회 요구 거절 ▲ 사업자의 도산으로 인한 장례 서비스 미이행 등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상조업체의 위약금이 일반 거래관행에 비춰볼 때 과도하다”며 “불입횟수가 많을수록 위약금 공제율이 높은 경우도 있어 약관을 잘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조회사에 대한 미흡한 제도로 피해가 속출하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회사의 ‘선수금 보전’ 등 할부거래 규제 추진에 나섰다. 상조회사들이 영업보증금을 공탁하거나 가입자들로부터 수령한 회비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예탁해 선수금을 보전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는 것. 공정위가 추진할 주요 규제 내용은 ▲ 영업보증금 공탁 ▲ 고객불입금 보전조치 ▲ 도산시 사업의 승계 ▲ 시장진입요건 등이다.
이필도 교수는 “문제는 자기 자본 없이 거의 100%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하는 것인데 이는 오른쪽 주머니 돈을 꺼내 왼쪽으로 넣는 꼴”이라며 “법과 제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보험회사 수준의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